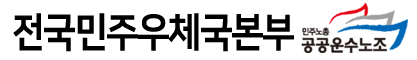[머니투데이]한밤 먼지속 사투, 하루 16만개 처리 우편집중국에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1-23 15:38 조회4,0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밤 먼지속 사투, 하루 16만개 처리 우편집중국에선
기사입력 2018-01-21 06:11 | 최종수정 2018-01-22 15:16 기사원문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이보라 기자] [전국 4799명 '무기계약직·기간제' 우정실무원, 고된 환경…"정규직 임금 절반만 줘도"]
지난해 9월 26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한 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어둠이 짙게 깔린 19일 저녁 8시.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은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분주한 모습이었다. 전국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는 이 시간이 되면 이곳 우정실무원들의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됐다.
우편집중국은 전국 각지에서 온 우편물의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동서울우편집중국에는 1000대가 넘는 차량이 하루 평균 15만~16만개의 우편물을 싣고 온다. 이곳에 모여든 우편물을 차량에서 꺼내 목적지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차량에 싣는 게 우정실무원의 업무다.
이날도 4층 등기통상계에서는 소형 우편물 분류가 한창이었다. 우편물 분류기계가 내는 소음 속에서 마스크를 낀 20여명 실무원들이 엽서, 편지, 책자 등 등기우편물을 분류하느라 쉴 새 없이 눈과 손을 움직였다.
우정실무원의 업무 강도는 만만치 않다. 일하는 내내 서 있는 데다 우편물 묶음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잦다.
올해로 우정실무원 18 년차라는 김모씨(56)는 "우편물을 쥐다 엄지손가락이 고장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팔다리 아프다고 침 맞는 건 일상이고, 허리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니 몸이 성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우편물에서 나오는 먼지 탓에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이들도 많다. 공기청정시설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2층 소포계에 있는 40여명의 우정실무원들은 짐수레에 있는 소포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옮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많게는 30㎏까지 나가는 소포를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옮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분류된 소포가 쌓인 300㎏의 짐수레를 차량에 다시 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정실무원들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종 장비 옆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무거운 짐수레에 발이나 몸이 깔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실무원은 소포 안에서 터진 화학약품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한동안 피부병을 앓았고, 기계와 부딪쳐 찢어진 이마를 꿰매기도 했다.
그렇다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우정실무원들의 임금은 한 달에 약 175만원(야근자 기준) 안팎 수준이다.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대부분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실제 우편 분류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정실무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있고 지난해까지는 식비 지급도 안 됐다. 직무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 등이 생겼지만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2년차 강모씨(53)는 "18 년차 직원과 내 월급이 거의 비슷하다"며 "근속수당 15만원 정도 차이인데, 이 수당도 2011년까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8000여명 중 우정실무원의 수는 지난해 기준 4799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비용절감 차원에서 채용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됐다. 상당 부분 작업을 기계가 대신 하고 있지만 바코드 인식이 안 된 우편물을 분류하는 등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필요한 업무다.
2012년 설립된 비정규직 독자 노조는 우정실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과 정원 한계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정실무원들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월급제·호봉제 전환,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현실화 등이 그들의 요구다. 강씨는 "정규직과 똑같이 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50% 이상만 줘도 박탈감은 덜 들 것 같다"며 "사람 사는 기분은 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입력 2018-01-21 06:11 | 최종수정 2018-01-22 15:16 기사원문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이보라 기자] [전국 4799명 '무기계약직·기간제' 우정실무원, 고된 환경…"정규직 임금 절반만 줘도"]
지난해 9월 26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한 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어둠이 짙게 깔린 19일 저녁 8시.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은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분주한 모습이었다. 전국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는 이 시간이 되면 이곳 우정실무원들의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됐다.
우편집중국은 전국 각지에서 온 우편물의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동서울우편집중국에는 1000대가 넘는 차량이 하루 평균 15만~16만개의 우편물을 싣고 온다. 이곳에 모여든 우편물을 차량에서 꺼내 목적지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차량에 싣는 게 우정실무원의 업무다.
이날도 4층 등기통상계에서는 소형 우편물 분류가 한창이었다. 우편물 분류기계가 내는 소음 속에서 마스크를 낀 20여명 실무원들이 엽서, 편지, 책자 등 등기우편물을 분류하느라 쉴 새 없이 눈과 손을 움직였다.
우정실무원의 업무 강도는 만만치 않다. 일하는 내내 서 있는 데다 우편물 묶음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잦다.
올해로 우정실무원 18 년차라는 김모씨(56)는 "우편물을 쥐다 엄지손가락이 고장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팔다리 아프다고 침 맞는 건 일상이고, 허리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니 몸이 성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우편물에서 나오는 먼지 탓에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이들도 많다. 공기청정시설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2층 소포계에 있는 40여명의 우정실무원들은 짐수레에 있는 소포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옮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많게는 30㎏까지 나가는 소포를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옮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분류된 소포가 쌓인 300㎏의 짐수레를 차량에 다시 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정실무원들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종 장비 옆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무거운 짐수레에 발이나 몸이 깔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실무원은 소포 안에서 터진 화학약품을 뒤집어쓰는 바람에 한동안 피부병을 앓았고, 기계와 부딪쳐 찢어진 이마를 꿰매기도 했다.
그렇다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우정실무원들의 임금은 한 달에 약 175만원(야근자 기준) 안팎 수준이다.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대부분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실제 우편 분류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정실무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있고 지난해까지는 식비 지급도 안 됐다. 직무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 등이 생겼지만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2년차 강모씨(53)는 "18 년차 직원과 내 월급이 거의 비슷하다"며 "근속수당 15만원 정도 차이인데, 이 수당도 2011년까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8000여명 중 우정실무원의 수는 지난해 기준 4799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비용절감 차원에서 채용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됐다. 상당 부분 작업을 기계가 대신 하고 있지만 바코드 인식이 안 된 우편물을 분류하는 등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필요한 업무다.
2012년 설립된 비정규직 독자 노조는 우정실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과 정원 한계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정실무원들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월급제·호봉제 전환,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현실화 등이 그들의 요구다. 강씨는 "정규직과 똑같이 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50% 이상만 줘도 박탈감은 덜 들 것 같다"며 "사람 사는 기분은 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