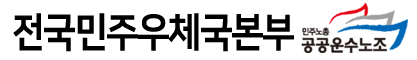[연합뉴스] 나는 집배원이다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30 11:25 조회3,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나는 집배원이다]① '情의 전령사'에서 고지서·택배 배달까지
기사입력2017.06.30 오전 6:50 최종수정2017.06.30 오전 6:52
1905년부터 집배원으로 불려…반가운 소식 상징 제비 로고로 친숙
최대 100㎞ 이동하면서 하루 10시간 우편물 평균 1천여 통 배달
[※ 편집자 주 = 집배원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입니다.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 택배 등이 이들의 손을 통해 전달됩니다. 무더위, 장맛비,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던 집배원, 그들이 최근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던 동료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집배원이라는 특정 직종의 문제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도 조금씩 커지는 분위깁니다. 연합뉴스는 어려운 여건에도 소임을 다하는 집배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물 4꼭지를 제작,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큰 가방 속에는 편지, 편지 들었죠.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동요 작곡가 정근(1930∼2015) 선생이 1950년대 중반 만든 동요 '우체부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어린이 대상 TV 프로그램에서 간간이 들을 수 있다.
전화 구경을 하기 힘들던 그 시절 집배원은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는 제비와도 같은 존재였다.
우체국을 상징하는 제비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넉넉한 가방을 멘 채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동네 아이들은 골목골목 졸졸 따라다니며 "우리 집에 편지 온 거 없어요?"라며 묻기 다반사였다.
이웃집 대문 앞에서 집배원이 소포 꾸러미를 주인에게 내밀 때면 무슨 큰 선물인가 싶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체전부·우체군 불리다 1905년 이후 집배원 명칭 사용
동요 제목에까지 쓰인 '우체부'는 정식 명칭은 아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 근대 우편제도가 도입된 뒤부터 이들은 체전부(遞傳夫), 분전원(分傳員), 우체군(郵遞軍) 등으로 불렸다.
그러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통신주권이 박탈되면서 집배원(集配員)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집배원은 편지나 소포 따위 우편물을 모아서(集) 배달하는(配) 사람(員)이라는 뜻이다.
우체국 측은 일본강점기에 탄생한 집배원이라는 이름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1999년과 2005년, 2009년 등 몇 차례 새 이름을 공모했지만 이를 대체할 적합한 명칭을 찾지 못했다.
집배원들은 1884년 우정총국에서 시작해 1948년 체신부, 1995년 정보통신부를 거쳐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이다.
원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력거→자전거→오토바이…등기우편 확인도 도장에서 PDA로 '진화'
체전부 시절 집배원은 말과 수레를 이용해 우편을 운반하기도 하고 일본강점기에는 인력거와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해방되고 1960년대까지 집배원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서 편지와 소포를 배달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들어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골목 골목을 그야말로 제비처럼 누볐다. 1983년 제비를 본뜬 로고가 첫선을 보이면서 제비 마크가 있는 조끼와 가방은 집배원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집배원 발이 돼 주던 자전거를 대신해 오토바이가 등장했다.
이 덕에 웬만한 달동네도 큰 어려움 없이 다다를 수 있었다. 물론 한겨울 눈이 쌓이면 큰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조심조심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등기우편을 배달하며 일일이 종이에 도장을 받던 것도 개인 디지털 단말기(PDA)에 사인을 받는 것으로 바뀐 지 꽤 오래다.
지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 주소를 인식해 배달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기계도 사용한다.
원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情) 나르던 집배원, 이젠 고지서·택배 배달 인력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 집배원은 단순히 편지와 소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과 정(情)을 주고받던 존재였다.
객지에 살거나 군대 간 자식이 보내온 편지를 받은 늙은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 편지를 좀 읽어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읽어주곤 했다. 가끔은 떡집에 우편물을 배달하곤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모(80)씨는 "옛날 유명한 찰떡 집에서는 가끔 집배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떡메로 떡을 쳐주곤 했다"며 "떡을 치는 일이 힘들다 보니 잠깐씩 짬을 내어 도와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이런 풍경은 시골 마을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먼 곳에 사는 혈육이 손으로 쓴 편지를 부치는 일도 거의 없거니와 떡메로 떡을 치는 곳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가정마다 각종 고지서나 택배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 업무의 대부분이 됐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편물의 양도 그만큼 늘어났지만, 대신 정을 나눌 기회는 줄어든 것이다.
원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국 1만6천여명…최대 하루 2천 통 배달하고 100㎞ 이동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집배원은 약 1만6천 명이다.
이들은 1주일에 평균 48.7시간 일한다. 그러나 신도시 등 업무가 몰리는 곳에서 근무하는 7천300여명(전체 집배원의 46%)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고 있다.
대체로 하루 평균 10시간 안팎 일하는 셈인데 배달시간은 5시간 30분(점심시간 제외)가량이다. 당일과 다음날 우편물 구분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는 내근이 5시간 안팎이다.
집배원 한 사람이 하루 배달하는 물량은 일반편지 859통, 등기 89통, 택배 34통 등 평균 980여통이다. 물론 신도시 등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경우, 이 수치가 2천통 안팎까지도 올라간다.
하루 이동 거리도 광역시는 40㎞, 신도시 등은 60㎞ 안팎이고, 농어촌을 담당하는 전국 집배원 600여명의 경우엔 무려 80∼100㎞에 달한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국민에게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집배원들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기사입력2017.06.30 오전 6:50 최종수정2017.06.30 오전 6:52
1905년부터 집배원으로 불려…반가운 소식 상징 제비 로고로 친숙
최대 100㎞ 이동하면서 하루 10시간 우편물 평균 1천여 통 배달
[※ 편집자 주 = 집배원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입니다.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 택배 등이 이들의 손을 통해 전달됩니다. 무더위, 장맛비,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던 집배원, 그들이 최근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던 동료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집배원이라는 특정 직종의 문제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도 조금씩 커지는 분위깁니다. 연합뉴스는 어려운 여건에도 소임을 다하는 집배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물 4꼭지를 제작,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큰 가방 속에는 편지, 편지 들었죠.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동요 작곡가 정근(1930∼2015) 선생이 1950년대 중반 만든 동요 '우체부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어린이 대상 TV 프로그램에서 간간이 들을 수 있다.
전화 구경을 하기 힘들던 그 시절 집배원은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는 제비와도 같은 존재였다.
우체국을 상징하는 제비 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넉넉한 가방을 멘 채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동네 아이들은 골목골목 졸졸 따라다니며 "우리 집에 편지 온 거 없어요?"라며 묻기 다반사였다.
이웃집 대문 앞에서 집배원이 소포 꾸러미를 주인에게 내밀 때면 무슨 큰 선물인가 싶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체전부·우체군 불리다 1905년 이후 집배원 명칭 사용
동요 제목에까지 쓰인 '우체부'는 정식 명칭은 아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 근대 우편제도가 도입된 뒤부터 이들은 체전부(遞傳夫), 분전원(分傳員), 우체군(郵遞軍) 등으로 불렸다.
그러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통신주권이 박탈되면서 집배원(集配員)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집배원은 편지나 소포 따위 우편물을 모아서(集) 배달하는(配) 사람(員)이라는 뜻이다.
우체국 측은 일본강점기에 탄생한 집배원이라는 이름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1999년과 2005년, 2009년 등 몇 차례 새 이름을 공모했지만 이를 대체할 적합한 명칭을 찾지 못했다.
집배원들은 1884년 우정총국에서 시작해 1948년 체신부, 1995년 정보통신부를 거쳐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이다.
원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력거→자전거→오토바이…등기우편 확인도 도장에서 PDA로 '진화'
체전부 시절 집배원은 말과 수레를 이용해 우편을 운반하기도 하고 일본강점기에는 인력거와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해방되고 1960년대까지 집배원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서 편지와 소포를 배달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들어 빨간색 자전거를 타고 골목 골목을 그야말로 제비처럼 누볐다. 1983년 제비를 본뜬 로고가 첫선을 보이면서 제비 마크가 있는 조끼와 가방은 집배원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집배원 발이 돼 주던 자전거를 대신해 오토바이가 등장했다.
이 덕에 웬만한 달동네도 큰 어려움 없이 다다를 수 있었다. 물론 한겨울 눈이 쌓이면 큰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조심조심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등기우편을 배달하며 일일이 종이에 도장을 받던 것도 개인 디지털 단말기(PDA)에 사인을 받는 것으로 바뀐 지 꽤 오래다.
지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 주소를 인식해 배달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기계도 사용한다.
원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情) 나르던 집배원, 이젠 고지서·택배 배달 인력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 집배원은 단순히 편지와 소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과 정(情)을 주고받던 존재였다.
객지에 살거나 군대 간 자식이 보내온 편지를 받은 늙은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 편지를 좀 읽어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읽어주곤 했다. 가끔은 떡집에 우편물을 배달하곤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모(80)씨는 "옛날 유명한 찰떡 집에서는 가끔 집배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떡메로 떡을 쳐주곤 했다"며 "떡을 치는 일이 힘들다 보니 잠깐씩 짬을 내어 도와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이런 풍경은 시골 마을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먼 곳에 사는 혈육이 손으로 쓴 편지를 부치는 일도 거의 없거니와 떡메로 떡을 치는 곳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가정마다 각종 고지서나 택배 물품을 전달하는 일이 업무의 대부분이 됐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편물의 양도 그만큼 늘어났지만, 대신 정을 나눌 기회는 줄어든 것이다.
원본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국 1만6천여명…최대 하루 2천 통 배달하고 100㎞ 이동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집배원은 약 1만6천 명이다.
이들은 1주일에 평균 48.7시간 일한다. 그러나 신도시 등 업무가 몰리는 곳에서 근무하는 7천300여명(전체 집배원의 46%)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고 있다.
대체로 하루 평균 10시간 안팎 일하는 셈인데 배달시간은 5시간 30분(점심시간 제외)가량이다. 당일과 다음날 우편물 구분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는 내근이 5시간 안팎이다.
집배원 한 사람이 하루 배달하는 물량은 일반편지 859통, 등기 89통, 택배 34통 등 평균 980여통이다. 물론 신도시 등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경우, 이 수치가 2천통 안팎까지도 올라간다.
하루 이동 거리도 광역시는 40㎞, 신도시 등은 60㎞ 안팎이고, 농어촌을 담당하는 전국 집배원 600여명의 경우엔 무려 80∼100㎞에 달한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국민에게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집배원들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