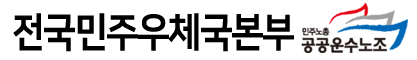안랩, 중소기업 보안 콘텐츠 허브 SMB Place 콘텐츠 센터 오픈!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ffin 작성일25-07-08 08: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서론 기존에도 윤리경영, 사회책임투자, 투명경영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사회 가치 경영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의 비재무적 환경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인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영역과 성과를 관리하여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전략이다. 한편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와 일자리 등 긍정적 혜택을 창출하지만, 우리 사회와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쳐왔다. 오염원 발생,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등 부정적 측면을 노출해온 것이 그러한 예이다. ESG 경영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파괴, 사회적 비판, 비윤리적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기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가치 하락을 예방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ESG는 2003년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ial Initiative), 이후 UNGC(UN Global Compact), UNPRI(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통해 구체화된다. 2004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UNGC)의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ESG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후, ESG 경영은 글로벌 기업 경영 트랜드가 되었고 지구촌이 당면한 기후변화, 사회 문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우형진, 2023).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부분 ESG 경영을 시행하고 있고, 매년 ‘지속가능성 경영 보고서’의 형식으로 자사의 ESG 경영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실제 2014년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2015년 파리기후협약,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 회장의 ESG 경영 실천 요구 서한 발송(Fink, 2020), 2020년 한국판 뉴딜(그린/디지털 뉴딜) 발표(문재인, 2020. 7. 14.) 등 ESG 경영의 추세는 가속되고 있으며 일종의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성장 전략이다. 이처럼 ESG의 핵심은 기업 행위로 인한 환경파괴, 사회적 이슈,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폐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의 마케팅, 홍보, 위기관리 차원이 아닌 기업문화와 관행에 ESG를 내재화하고, 모든 조직과 부서가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고려하여 기업 행위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기업들이 ESG 관련 비재무 성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기존의 투자 자산을 회수하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전 세계 다수의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가치 판단에 ESG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ESG 투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그린뉴딜 정책 등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찾았고, 2023년부터는 양적 성장 단계를 지나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 앞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우리나라와 중요한 무역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ESG를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SG 투자는 주요국들의 탈탄소 정책 강화에 따라 원자재, 전력 가격 상승 등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 발생하고 있다. ESG 투자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며 기후재난 증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ESG 법제화 등의 이유로 ESG 투자는 질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간접규제 형식으로 삼아 모든 기업들의 기업행위 평가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ESG 요소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가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시장진입, 사업 전개가 증대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용환, 2024).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ESG 경영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기업의 ESG 공시(公示)가 의무화되는 트렌드이다. 그동안 비재무적 요소로만 간주해 왔던 ESG는 이제 지속가능성 정보로 불리며, 재무제표와 동등한 수준의 공시 대상으로 격상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유럽을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neutral)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EU의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 금융을 위한 로드맵(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확정했다. 미국도 기후 관련 기업 공시 등 ESG 관련 활동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5년(혹은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 2030년에는 코스피(KOSPI)의 모든 상장사가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속 가능 경영으로 성과를 인정받기 위한 ESG 경영이 필수인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이처럼 대전환기에 기업은 우선순위로 ESG 경영시스템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별 ESG 규제 및 정책 제도화 추진에 대응해야 하며, ESG 공시를 통한 자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경우 ESG 경영을 선언하거나 공시한 경우가 많지 않다.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원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줄이고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기업이 실천해야 하는 경영 목표이자 방향성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은 시작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기업의 업(業)의 특성에 적합하게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수 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하고 자원을 공유하여 더불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 기업의 종류, 특성, 방송·콘텐츠 기업의 ESG 경영 현황과 사례, ESG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미디어 기업의 특성과 ESG 필요성 좁은 관점에서 미디어를 보면 방송 및 신문의 뉴스 미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미디어를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정보통신, 인터넷 플랫폼, OTT 스트리밍,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교육, 과학, 출판, 엔터테인먼트와 연예, TV 홈쇼핑 회사까지 전부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미디어 산업과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적 오염 요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환경파괴 영향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운 산업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 미디어는 모든 영역에서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갖고 연결되어 있어서 ESG 분야에서 제외할 수 없는 필수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미디어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이 특정 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제 미디어 산업도 다른 산업처럼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동일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ESG를 독려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이다. 보도를 통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확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 사회구성원들의 일상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과 통신기업은 ESG 확장과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ESG 내용들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우형진·유승철, 2015우형진, 2021). 또한 미디어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물리적이거나 사회 운영 체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적, 정신적, 상징적, 문화적, 사회적, 비물질적 정보와 표현이고 콘텐츠 상품이라는 특성이 있다. 신문사와 방송사가 생산하는 기사와 보도, 프로그램 콘텐츠는 ‘지적 정신 상품 생산물’로서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brain printing)을 미치는 비물질적 형태이기에 ESG 요소의 측정이나 모니터링이 주관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 상품은 양적이기보다는 질적인 성향을 갖는 특성 때문에, 정보 콘텐츠에 대해 공통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Confino, 2009). 이러한 이유로 물리적인 탄소 배출량보다 탄소 배출량을 다루는 환경 프로그램, 유능한 진행자 혹은 날씨를 진행하는 기상 캐스터 등의 인식과 역할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광고 메시지의 경우, 직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보, 메시지, 콘텐츠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국내 미디어 기업들은 신문 기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을 독려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온 점이 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넘어 미디어 기업 자신이 내부를 들여다보고, ESG 전략을 수립하고 투명한 내부 정보 공개를 통하여 지속 가능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스스로 책임 있는 미디어가 되어야 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불편부당한 보도 및 제작, 지역사회 기여, 지속 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김태환·정현상, 2022). 방송, 통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기업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 기업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이며 지적인 생산물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다른 일반 기업이 생산하는 사유재와 다른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적 운영과 공익적 의무가 요구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규제(사업 인허가, 편성, 내용, 광고 규제 등)도 수반되는 규제산업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는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인프라에 접속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며,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관리하는 주체인 미디어 기업은 유료 및 무료 서비스에 무관하게 공적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다(이원재·이봉현, 2011), 가령, 공공재인 주파수를 수탁받은 지상파 방송사는 공영·민영 방송구조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법에 근거한 인권보호와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 제작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주 제작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며, 최상의 수준으로 시청자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통신기업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책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는 저가에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서비스 관련 정보와 세부 가격은 공개해야 하고,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우, 포털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검색 광고 순위 배정에 있어 불공정한 차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게임 기업은 온라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게임 콘텐츠의 폭력적이고 유해한 표현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규제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정보 유통에 앞장서야 한다. 유해한 정보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미디어 기업은 인적자원 관리, 기후 위기 대응에 소홀하거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경영진이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주주제안이 수행될 수 있다. 통상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선임하여 거버넌스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500건 내외로 주주제안이 활발하다. ESG 분야별로는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환경 부문 주주제안 비중이 전체 안건의 약 35% 비중으로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한국투자증권, 2024. 5). 또한 미국은 국내와 달리 ‘권고적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가령,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 공시를 하라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다면 해당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주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는지 투표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업은 해당 이슈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최용환, 2024).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정신 상품’은 단순한 물리적 제품이 아니라 비물질적 콘텐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 인권, 가치관, 문화, 인간관계, 여가생활 등 사회공동체의 전반에 걸쳐 근본적 토대를 강화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의 인적 구성 차원에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DEI를 통하여 ESG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하는 것은 경쟁 상황에서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방편일 것이다. 이제 미디어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 ESG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 기업경영 전략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3. 미디어 기업의 중대성 이슈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미디어 기업이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포함하는 지침을 제시했다. GRI의 미디어 영역 지침(GRI’s Media Sector Supplement)은 7개(콘텐츠 평가 및 모니터링, 콘텐츠 창작 가치 개선 및 결과물 평가, 콘텐츠 유통, 수용자 불만 사항 개선 및 대응, 수용자와의 상호작용,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수용자 주권 향상, 재정 조달) 영역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담보할 것을 권장했다. KPMG(2004)는 미디어 기업, 일반 기업, 미디어 및 일반 기업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책임활동 경영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중 미디어 기업 고유의 영역과 일반 기업처럼 실행할 수 있는 확장된 사회책임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산업 고유의 CSR 영역은 공정성 및 균형 잡힌 결과물,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창의적 독립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편집 정책, 가치창조, 미디어 리터러시이다. 둘째, 미디어 기업이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CSR 영역은 사회, 환경 이슈 홍보, 데이터 보호, 건강, 안전, 치안 문제, 자선 활동 홍보, 인권, 투명한 소유, 다양성, 프라이버시, 정보격차, 여론 전달, 비정규직 공정한 대우, 교육, 시민권 옹호, 예능과 오락, 저작권 침해 방지, 정확한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 이용자 요구 반영, 규제 준수 및 자율규제이다. 그러나 미디어 기업의 경영자들과 종사자들이 기업 목표인 이윤 창출과 시장지배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지가 특정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만 적용하는 한시적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몇몇 이벤트성 프로그램 이행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요 경영철학과 모든 관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CSR 대상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한다(O’Connora·Shumate &Meister, 2008). 미디어의 사회책임 경영 차원에서 CSR 내용을 참고하여 CSR보다 구체화되고 강제성이 발생하는 ESG 경영 원칙이 필요하다. ESG와 관련하여 미디어 산업에 적용해야 할 요소는 정보, 평판, 브랜드 이미지, 신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이 미디어 사업의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언론의 뉴스 보도의 경우 기업의 ESG 활동 및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과 기업, 공중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박준규 등, 2022). 또한 언론을 ESG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반영하는 영향력 있는 제3자로 간주하기도 한다(Burke, 2022). 특히 언론은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김원섭·남윤철·신종화, 2015), ESG 관련 뉴스 보도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미디어 보도가 기업의 CEO 해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버크(Burke, 2022)는 미국의 910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ESG 관련 부정적인 미디어 보도 총 5,864건과 기업의 CEO 해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한 언론이 ESG 관련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보도하는 경우 기업 이사회에서 CEO를 해임할 가능성이 크며, ESG 경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거나 ESG 경영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한 기업일수록 ESG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이후 CEO를 해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박노일· 박대근·정지연, 2024). 한편 2022년 발간된 영국 RMF(책임 있는 미디어 포럼) 미디어 산업의 중대성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디어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산업의 중대성은 단기, 중기에 걸쳐 재무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한다. 중대성 이슈는 기후변화, 데이터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책임 있는 콘텐츠,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직원 복지 등이다(RMF, 2022). 글로벌 ESG 지표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가령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산업군에서 보는 지표는 크게 다섯 가지를 중요하게 본다. 첫째, 다양성으로서 제작 콘텐츠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절차에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임직원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한다. 둘째, 콘텐츠의 독립성과 잠재적 편견의 투명성, 사생활 보호와 위해성 등이다. 셋째, 지적 재산 보호, 미디어 불법 복제이다. 넷째,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 발자국이다. 다섯째,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광고 표준,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안 등이다(신지현, 2022). 구체적으로 ESG 방송 콘텐츠 기업의 중대성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디어 기업의 ESG 투자는 산업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대성(Materiality), 지속가능성 이슈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이를 핵심 사업모델인 콘텐츠의 제작, 유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본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피드백을 면밀히 반영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높은 기업 가치를 달성할 것이다(최용환, 2024). ESG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공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기업이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때 산업별·기업별로 중요한 ESG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민간표준기구에서는 중대성(Materiality)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공시하고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며, 평가기관 및 투자자들은 산업별·기업별 주요 ESG 이슈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미디어 산업에서 어떤 ESG 이슈가 중요할 것인지에 대하여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연구기관인 SASB(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의 중대성(Materiality)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첫째, 책임 있는 콘텐츠(Responsible Contents)가 중요하다. 미디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메시지를 가진 ‘콘텐츠’를 생성하고, 전송하는 것이 업(業)의 본질이다. 이때 미디어 기업은 자기 자신을 존속시키기 위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우형진, 2022),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지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가치 있고 책임 있는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중요하다. 인적자본은 인적자원 관리와 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디어 기업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인력에 대한 관리가 사업의 핵심이다. 방송사가 독립 제작업체 등에 하청 및 재하청을 주는 복잡하고 구조적인 제작 공급망에서 과다한 근로 시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해지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 2024년 3월 최종 승인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강화되면 미디어 산업에서도 인권·환경에 대한 관리 체계 및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미디어 산업은 제조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하여 탄소 배출량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 관리(Energy &Carbon Emission)가 중요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그린피스에서는 Clicking Clean 캠페인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왔으며(Green Peace,2015. 5), 2023년부터 우리나라 환경부는 2040년 디지털 탄소가 전체 배출량의 14%를 차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Privacy &Data Security)가 중요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을 통해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DMA를 위반할 경우 각각 전 세계 연매출의 6~10% 수준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며, 최근 실제로 애플·구글·아마존·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한국경제, 2024. 4. 1).4. ESG를 반영한 방송 콘텐츠 사례 미디어 기업은 ‘정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특히 텔레비전 방송콘텐츠는 대중문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종 정보 프로그램에서 문화정보를 얻고,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연기에 공감하며, 오락 프로그램에서 유머와 풍자를 통해 현실 세계를 되돌아보고 즐긴다. 텔레비전 방송은 우리의 일상적 문화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의 대상인 콘텐츠는 기존의 문화를 매개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방송 콘텐츠는 미술, 음악, 오락, 스포츠 등 고급 취향의 문화에서 대중 취향의 문화까지 아울러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은미·이혜미·오수연, 2012). 방송 콘텐츠 산업과 기업의 경우 제조기업에 비하여 탄소 배출량은 높지 않더라도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문화적 생산물인 콘텐츠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며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SG 관련 프로그램 34개(ESG의 소재로 제작된 방송콘텐츠)를 분석(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SG의 소재를 방송한 채널은 YTN 사이언스 22개, MBN 5개, MBC 3개, TV조선 2개, KBS 1개, 연합뉴스TV 1개였고, 방송 장르는 다큐멘터리가 30개, 토크쇼가 3개), 현안 이슈(Current Affairs)가 1개였다. 34개 프로그램 중 E(환경)를 주제로 설명한 콘텐츠는 85.3%, S(사회)를 설명한 콘텐츠는 73.5%를 차지했으며, G(지배구조)를 주제로 설명하는 콘텐츠는 8.8%에 불과하였다. 콘텐츠 비중상 E(환경) 부분에 치우쳐 있었고 S(사회) 부분은 인권,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업무 환경 개선과 같은 부분은 빠진 상생협력, 사회공헌 내용에 치우친 결과를 보였다. G(지배구조)는 조직 구성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 있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 사업성과에 대하여 듣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가시적이고 정량적 목표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어, 콘텐츠 역시 기업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ESG 경영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SG라는 것을 매개로 홍보와 마케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는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기업의 ESG 경영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ESG 기업활동에 대한 홍보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S(사회) 부문에서는 사회공헌 활동과 협력 업체와의 공생을 주요한 사업으로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기업이 제시하고 그 부분을 미디어가 강조해야 한다. G(지배구조)는 투명성과 정보공개,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리더십과 조직문화와 같은 활동이다. E(환경), S(사회) 부문과 달리 실사례로 알려주는 형태가 아닌 대표자가 나와 텍스트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청자는 G(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선진국들은 지배구조, 사회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환경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우수 사례 중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들이 포함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대기업에 치우쳐 있었다. 중소기업의 사례도 있지만 대기업이 준비하는 ESG와는 거리감이 있었다(김성근, 2023). 이처럼 기업들은 환경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ESG 콘텐츠의 경우 환경 부분(주로 탄소중립을 강조)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이 제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친환경에 투자, 그린캠페인, 친환경자재 사용, 재활용 등과 같은 노력보다는 원자재 및 사회공헌 활동을 보여주는 데 치우쳐 있다. ESG의 S(사회) 영역에서도 많은 콘텐츠의 주제가 대부분 상생협력, 소외된 계층의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 즉, 기업 내부의 임직원,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경영 활동 및 제조에 관련된 협력 업체와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를 위한 안전, 보건, 인권보호, 개인정보, 책임구매, 사회공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성과를 내고 싶다면 거버넌스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즉 S(사회) 영역에서 더 다루어야 하는 사안은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기업들의 자세와 사례, 여성 고용 비중, 직원 복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배구조(G) 영역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는 정태적 ‘지배구조’라기보다는 동태적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경영상태를 넘어서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Park and Yoon, 2022). 지배구조 부분에서 사례를 보여준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ESG 전문 부서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조직이 있음을 기업대표의 말로 전달하는 데 그쳐 소비자 및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를 정도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5. 국내외 방송사 ESG 경영 동향 가) 국내 지상파 방송사 ESG 경영 동향 최근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들도 ESG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국내 지상파 방송사도 ESG 경영의 흐름이 세계적 추세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정부 및 기관의 ESG 관련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ESG 경영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인 KBS는 공영방송, MBC는 공영적 민영 혹은 민영적 공영방송, SBS는 민영방송, EBS는 교육방송의 지위를 가지면서 채널별로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역할이 다르다. 각 채널이 지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시청자에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ESG 경영 전략 역시 채널 정체성에 걸맞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KBS, SBS, MBC, EBS의 ESG 경영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영방송 KBS는 ESG 경영 활동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2023년 5월 9일). 2024년까지 KBS는 한국형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 탄소계산기를 개발하기로 발표했다. KBS는 탄소계산기를 미디어 산업 분야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고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측정하여 감축 목표를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수선, 2023. 5. 9). 또한 2023년 말까지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친환경 탄소 저감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교체, KBS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법정 의무 설치 비율 15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총량 경영보고서 공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다큐멘터리 10편 이상을 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예를 들면 KBS의 탄소중립 생활 예능프로그램인 〈오늘부터 무해하게〉가 방영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ESG 콘텐츠가 제작되었고, 흥행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민영방송 SBS의 경우 환경 영역 활동에서 방송 프로그램(〈물은 생명이다〉, 〈공생의 법칙〉 등)을 제작하고, SBS 연예대상에 ‘에코브리티상’ 부문을 신설하였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예인을 통하여 환경 교육, 환경 의식 고양 등을 알리며 SBS 건물 친환경 운용, 온실가스 배출량 공지, 수도 소비량 공개, 폐기물 발생량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홍보한다.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이슈를 다루는 TV 프로그램 제작, 구성원 다양성, 평가 및 보상, 근로 환경, 여성 친화 정책과 제도, 노사 협력, 안전 보건, 정보 보호, 협력사 동반 성장,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구성, 이사회 개최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의 권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윤리 경영, 대외 ESG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SBS는 지난 10년 동안 SBS의 사회공헌 활동 총괄 기구인 ‘희망내일위원회’의 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 TV〉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SBS는 2023년에 기존 SBS의 ESG 관련 활동들을 재점검하고, ESG 경영의 의미와 필요성, ESG 제도와 규범 확인, 미래의 ESG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조성원, 2023. 11. 11.). 한편 SBS는 한국 ESG기준원의 평가를 받는 방송사로서 ESG 경영 전략, 환경 경영 전략,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KCGS에서 평가한 SBS의 2023년도 종합 평가등급은 B+이며, 환경 B+ 사회 A 지배구조 B+이다. 2022년도 종합 평가등급은 C, 2021년도 종합 평가등급은 B를 받았다. 현재 SBS는 ESG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사의 ESG 경영 방침을 공개하고 있다. 공영적 민영방송 체제인 MBC는 환경영역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인 환경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고 매년 환경 세부 실천 과제를 수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2021년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 12대를 업무용 차량으로 도입했고, 자사 시설 및 장비로 인한 환경파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사회 영역의 경우, MBC는 GRI 기준(가령, 경영 비전, 재무 현황, 보편적 시청권, 편성규약 준수, 심의 및 모니터링, 시청자 권익, 공정 거래 및 상생 등)에 따른 항목 대부분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방송사 내부 갑질 제보나 사회공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없고, 자선 활동도 주로 현금 기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MBC는 현금 기부 방식에 변화를 모색하여 재능 기부나 지역사회 봉사 형식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영역에서 공영방송사로서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을 직접 수행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이나 설명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다. MBC는 실천적 의미에서 ESG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평가 지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 ESG 실천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MBC의 생존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오행운, 2023. 11. 11).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회계 감사, 방송 평가 및 재허가 심사, 감사원 감사, 국정 감사, 경영 평가 등 다수의 평가와 심사를 받고 있어 ESG 경영까지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 공영 시스템으로 교육방송의 책무를 맡은 EBS는 2022년 12월 “ESG를 통한 EBS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내부 실천 방안을 수립했다(EBS, 2023. 3). EBS는 환경영역에서 그린-컵 캠페인 추진, 세트 재활용률 제고, 3층 걷기를 통한 건강-에너지-활력 찾기 캠페인, 출력물 one-paper 캠페인을 설정했다. 사회 영역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개선, 대국민 독서 진흥, 지역 상생 콘텐츠 제작,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 추진, 학력 격차 해소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ESG 콘텐츠 위원회 설립, 복무 기강 확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갑질 행위 및 부정행위 대상 제보, 자금 및 계약 담당 직원 비위 방지 대책, ESG 목표 수립 및 실행 체계화를 포함한 강력한 준법 윤리 경영을 추진하기로 했다(우형진, 2024). 나) 해외 공영 방송사의 ESG 경영 해외 공영방송사들은 ESG 경영을 자사의 지속 가능 경영 방침으로 채택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그룹 연례보고 및 회계 2022/23 보고서’에서 자사의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DEI) 정보, 성별/직종별 급여 격차, 환경, 자선 활동, 동반 성장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BBC, 2023). 환경 영역에서 BBC의 탄소 배출 zero를 목표로 수립하고,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에서 감축한 탄소 배출량의 실체를 제시했다. 또 공급망, 출장, 건물 운용, 설비와 기구 사용, BBC 스튜디오 운영, 종사자 출퇴근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통계를 제시했다. BBC는 사회 영역에서 공적 책무(공정한 뉴스와 정보 제공, 세대 교육, 고품질 서비스, 공동체 다양성, 영국의 문화와 가치 홍보)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종사자의 근무 환경, 인권, 교육, 연봉 공개 등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실행보고서에 밝혔다. 지배구조 영역에서 BBC는 12명 전체 이사진과 경영진의 기본급, 세금 공제액, 연금, 성과 보수까지 투명하게 공시했고, 보도 시사국, 라디오, 스포츠 담당 주요 프로그램 책임자와 진행자의 급여 총액도 공개했다. 일본의 공영방송사 NHK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와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환경 영역에서 NHK 방송센터 탄소 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세트장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3R(Reduce, Reuse, Recycl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NHK, 2022). 사회 영역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중시하고, 해설 방송, 수화 방송 등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출연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 젠더 등으로 인한 다양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초과 근무 금지, 효율적인 업무 방식 추구, 일과 삶의 균형, 개혁 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이사진 보수 및 급여 공개, 경영 계획,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내용 공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다) 해외 OTT 넷플릭스(Netflix)의 ESG 경영 ESG 경영은 사업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을 ESG 관점으로 전환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대하여 미디어 기업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과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사례로 넷플릭스의 탄소중립 및 다양성 정책을 볼 수 있다. 즉 미디어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은 첫째, 콘텐츠 주제를 ESG 콘셉트에 맞게 생산하는 경우와 둘째,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ESG 이슈를 고려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190개 이상의 국가에 30개 이상의 언어로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 넷플릭스는 영상물에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작자들과 일한다. ESG와 관련한 활동 중 특히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2019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Netflix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Report〉에서 스스로를 “다양한 장르와 언어를 통해 최고의 스토리로 세상을 즐겁게 한다.”와 더불어,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로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것의 전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다.”라고 제시한다. 즉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고유의 사업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존중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활동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창작자 지원 정책에서 넷플릭스 창작발전기금을 조성 및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라틴계(Latinx Inclusion Fellowship Series), 아시아계(Future Gold Film Fellowship), 독일(German-Language Screenwriters and Launches Accelerator Program), 영국(Documentary Talent Fund) 등 신진 제작자 육성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Collectif 50/50, Into the Wild, Netflix and Canadian Academy Directors Program for Women, Narrative Short Film Incubator for Women of Color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Environmental) 넷플릭스는 기후 위기 이슈를 다룬 〈돈룩업(Don’ Look Up)〉 해양생물을 다룬 〈나의 문어 선생님(My Octopus Teacher)〉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우리의 지구(Our Planet)〉 등은 1억 이상 가구에서 시청했다. 넷플릭스는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Reduce) 계획을 세우고, 열대우림 등 생태계를 보존(Retain)하는 REDD+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회사의 배출량을 상쇄하며, 맹그로브 숲 등 자연 생태계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를 제거(Remove)하여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박영주, 2021). 넷플릭스는 2022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물 운영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대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과 스트리밍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 2020년 전 세계 1억 6,000만 가구가 기후 문제와 관련된 넷플릭스의 영상물을 시청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사회(Social) 넷플릭스의 서비스는 구독 기반이며, 제3자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시청 추천 시스템을 위해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사회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등 정보보안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양성 정책을 통해 2022년 기준 아시아 직원의 비중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히스패닉 직원 비중이 0.1% 소폭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보호 장치, 무단 수정 혹은 오용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속적인 테스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3) 지배구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임직원들이 월간 회의, 분기회의 등 정기적으로 회의체를 개최해 기업이 당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집중한다. 이사회 구성원 및 관리자, 임원진의 여성 및 인종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며 여성 이사들은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들의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6. CJ E&M의 ESG 경영 사례 (출처: CJ ENM 홈페이지, ESG REPORT) 가) CJ ENM 사업 개요 CJ ENM은 국내 대표적인 다채널방송사업자(MPP)로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방송 채널(드라마, 예능, 스포츠,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다. CJ ENM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글로벌 IP(지식재산권)의 산실으로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TV 채널, 스트리밍서비스(OTT)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CJ ENM은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 스펙트럼을 확대하고자 제작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동 기획 및 제작, IP 프랜차이즈, 글로벌 협업 등 체계적인 제작 스튜디오 구조를 확립하여 여러 우수한 IP를 확보하였고, 산하에 제작 스튜디오(스튜디오 드래곤)들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쇼핑사업자로서 CJ ENM은 2021년 5월 TV쇼핑과 T커머스, 이커머스 채널 통합브랜드 ‘CJ온스타일’을 론칭했다. TV,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숏폼 등 CJ온스타일이 보유한 전 채널 연계 전략인 ‘원플랫폼’ 체계 안에서 영상 기반 큐레이션 콘텐츠를 선보이며 브랜드사에게는 차별적 가치를, 고객에게는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CJ ENM은 유료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ESG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ECP(Eco-balanced Content Production))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환경 구축’을 추구 차원에서 출범된 ECP 이니셔티브는 현재에도 지속중이다. ECP 이니셔티브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작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원칙과 기준, 공동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개방형 협의체로, 2022년 12월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ECP 표준은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CJ ENM은 빠르게 진화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ESG 변화에 발맞춰 ECP 표준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한다. CJ ENM은 ECP 표준에 기준한 콘텐츠 제작 및 연구를 지속해 콘텐츠를 통해 ESG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려고 하고 노력한다. 나) CJ ENM 중대성 평가 결과 CJ ENM은 매년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ESG 이슈 중 중대하게 다루어야 할 토픽을 선정하고 〈ESG Report〉를 통해 공개한다. 〈2023 ESG Report〉에는 지속 가능경영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GRI Standards)과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의 이중 중대성 개념을 반영하여 중대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환경·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ESRS 기준서와 CJ그룹의 표준 중대성 평가 방법론을 준용하였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 의견을 통해 일반적인 이슈별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후 전문가 그룹 의견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CJ ENM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최종 선정된 ESG 중대 이슈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CJ ENM은 환경·사회적 영향도와 재무적 영향도를 고려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7개(환경 1개, 사회 4개, 거버넌스 2개)의 중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산업 내 경쟁력과 고객을 위한 사업활동을 비롯하여 노동인권, 윤리·준법 경영 등 ESG 관련 이슈가 핵심 보고 주제로 선정되어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CJ ENM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7개 중대 이슈와 관련된 활동과 성과는 다음 〈표-3〉과 같다. 중대 이슈 관리 차원에서 CJ ENM은 ISSB(IFRS S1, S2)와 GRI Standards 2021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ESG 중대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ESG 중대 이슈와 관련된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하여 전략에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슈별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사회 및 ESG위원회는 중대 이슈 관련 보고, 검토, 승인을 통해 영향 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다) CJ ENM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CJ ENM에서는 2017년부터 신인 창작자 발굴 육성 프로젝트 오펜을 시행하고, 단막, 영화 부문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숏폼 부문을 신설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신인 창작자 발굴부터 콘텐츠 기획·개발, 제작·편성, 비즈 매칭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작자 육성 사업 ‘오펜(O’PEN)’은 창작자의 데뷔 기회와 업계의 신규 크리에이터 수급으로 선순환 구조 확립하고 있다. (1) 환경 부문 CJ ENM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저감 등 환경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팀, 총무안전팀, 물류센터팀 등 ESG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CJ ENM은 의무 검증 기업이 아님에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튜디오 센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일러 설비 정기 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전 사업장 및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생활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고 협력사의 폐기물 감축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사적 차원에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① 지속 가능한 콘텐츠·상품·서비스중대 이슈로 도출된 지속 가능한 콘텐츠·상품·서비스에 대해 다른 중대 이슈와 함께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상품·서비스 기획 및 추진은 CJ ENM의 전 실무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의 기획·개발은 물론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커머스 부문은 PB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기획 및 제조를 주도하는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국내 사례인 CJ ENM의 경우, 비주류 장르를 조명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성공적 방영,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를 방영한 2021년에 전년 대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3배 증가한 1만 6,231명을 기록하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② 친환경 추친 전략: 지속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친환경 패키징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테이프 대신 접착제가 필요 없는 ‘에코 테이프리스 박스’와 ‘종이 행거 박스’를 도입하여 실용신안으로 등록하였다. 2022년부터는 ‘비닐 테이프 OUT’을 선언하여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전면 교체하여 친환경 패키징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에코 패키징 투게더(Eco Packaging Together) 캠페인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에 올바른 포장 가이드 및 분리배출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3무(無) 3R 친환경 정책CJ ENM은 환경부와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바탕으로 TV 홈쇼핑 업계 최초로 비닐(플라스틱), 부직포,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3무(無) 포장재’를 도입하고, ‘3R(Reduce, Redesign, Reuse) 정책’을 수립하여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③ 환경경영 활동• 대기오염 환경영향 저감CJ ENM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 저감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CJ ENM 스튜디오 센터의 보일러 기계설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 배출량을 전문 측정업체 의뢰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일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저녹스 버너(연소 조절 장치)를 통한 NOx(질소산화물) 저감과 함께 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리한다.• 수질오염 환경영향 저감CJ ENM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용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된 용수 일부를 재사용한다. CJ ENM 센터에서 한 번 사용한 수돗물(세면대, 탕비실, 샤워실 등)은 중수도 설비 시스템을 통하여 정화하여 화장실 소변기, 양변기에 재사용한다. 또한, 해당 중수도 설비 시스템의 필터(MCF, AC)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탁도, SS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폐기물 감축 노력CJ ENM 스튜디오 센터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VP Stage)에 위치한 LED 미디어 월(Wall)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여러 실내외 장소에서 진행되는 로케이션 촬영을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물리적인 세트 제작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고 있다. 2023년 10월, 11월에 진행한 6번의 홈쇼핑 방송에서는 실물 조명을 94대의 언리얼 XR 가상 조명으로 대체하여 약 6,000kW의 전력을 저감할 수 있었다. 또한, 무대 연출을 위한 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송 제작 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다. CJ ENM은 2023년 기준 미디어 월 스튜디오를 통해 방송 세트 폐기물의 발생량을 55톤 감축하였으며, 전력 사용량은 LED 조명 교체 이전인 2019년 대비 88%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④ 기후변화 대응 정책• TCFD 대응 프로젝트 진행CJ ENM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파리 기후 협정을 지지한다. CJ ENM은 2021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23년 기후변화 관리 고도화를 위해 TCFD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CJ ENM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Scope 1), 간접 온실가스(Scope 2), 기타 온실가스(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 등의 직접 배출부터 외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 경영 활동에 따른 기타 간접 배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매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자검증과 자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서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투자CJ ENM은 2023년 적극적인 친환경 투자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CJ ENM 사업장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자체 제작시설인 일산 스튜디오 내 기존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한 친환경 투자를 진행하였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뿐만 아니라 전기 카트를 구매하고, 사업장 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여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SCOPE 3 배출량 산정CJ ENM은 2023년 기타 온실가스(Scope 3) 배출량 산정 고도화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배출원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GHG Protocol에 기반한 카테고리 식별,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는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Scope 3 각 카테고리별 적정한 산정 방식 검토, 데이터 적정성 파악 및 배출계수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카테고리 1, 2, 3, 4, 5, 6, 7에 대해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중 카테고리 7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았다.⑤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및 관리CJ ENM은 2021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23년 기후변화와 관련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4가지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 관리 지표CJ ENM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Scope 1+2) / tCO2eq(단위) / 15,972(2023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Scope 1 913),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Scope 2 15,059)- 온실가스 기타 배출량(Scope 3 55) / tCO2eq(단위)- 비재생에너지 사용량(337) / TJ(단위) (2) 사회 부문 사회적 측면에서 전체 임직원 중 과반수가 넘는 56%가 여성 구성원이며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2018년 40%, 2019년 42%, 2020년 43%, 2021년 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직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자녀 입학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패밀리케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제작 현장의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수립 및 자율안전관리 실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작업 환경별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① 노동인권(인권 존중 및 보호): 인권경영 정책CJ ENM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인권경영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인권경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도화를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취업규칙 내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불평등 대우와 차별 등 인권침해 금지조항을 명시하여 임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인권 고충 처리 시스템CJ ENM은 인권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개 채널을 운영한다. 팀장 이상 리더, 경력사원 신규 입사자 등의 임직원과 협력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고충 처리 채널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임직원이 고충에 대해 사내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2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② 콘텐츠·상품·서비스의 선한 영향력: 콘텐츠를 통한 문화 나눔 캠페인CJ ENM은 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CJ ENM은 콘텐츠 영향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CJ도너스캠프와 협력하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수어 동시통역을 적용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제작발표회’로 화제가 되었던 tvN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드라마와 연계한 모금으로 청각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을 초청하여 영화 〈더 문〉 배리어프리를 적용하에 관람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tvN 〈무인도의 디바〉와 연계하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콘텐츠를 통한 강소기업 우대제도CJ ENM은 ESG 산업 전반의 ESG 경영활동 확대와 파트너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콘텐츠와 광고 분야에서 우선 신설하였으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③ 밸류체인 전반의 안전 및 보건콘텐츠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촬영, 공연/행사 등 다양한 작업 환경별로 적합한 안전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대 및 세트의 안전 기준을 반영한 무대의 설치·해체, 관람객 운영 등을 수행하여 안전 관련 위험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한다.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감축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안전관리팀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조직을 구축하여, 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교육, 안전모와 소화기를 비롯한 안전 물품 제공 등의 안전보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④ 위험관리: 고객 권익 침해 리스크 대응, 방송 심의 준수 및 허위·과장 광고 방지CJ ENM은 시청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상품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커머스 부문에서는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고 자막의 가독성을 높이며, 상품 정보를 보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방지하고 있다. ‘방송에서만’, ‘마지막’, ‘단 한 번/단 하루’ 등과 같은 한정 표현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해 방송 자막과 출연자 멘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방영 위한 방송 심의 규정 가이드 운영CJ ENM은 각 부문별로 방송 심의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자체 심의)에 의거하여 폭력이나 충격 및 혐오감, 건전성,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등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는 내부 방송 심의 규정 가이드를 수립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연출이 반영된 콘텐츠가 방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보유한 전 채널에서 편성하는 모든 영상물은 100% 전수 심의를 진행한 후 방영하고 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